밥이 다가 아니었어

2012.10.17 13:19
7,596
0
0
본문
교회에서 우리가정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말한다.
“애들이 쌍둥이 인가요?”
그도 그럴 것이 연년생으로 태어난 두 딸이 너무도 닮았다.
아이들이 연년생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부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.
세상에... 사람이 이렇게 바쁠 수도 있다니...
게다가 체구가 작은 나는 늘 몸살이 나거나 살이 빠져 주위에서 안타깝게 바라보기까지 했으니 매사 자신감 넘치던 나에게는 얼마나 새로운 세상이던지...
누군가 나를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안타깝게 바라본다는 게 너무 싫었다.
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신랑에게 집에 가자고 졸랐으니 참으로 부족한 아내의 모습까지 보이며 살았다.
그러다 하루는 이런 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? 싶으면서 밥은 먹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것이었다.
그래서 신랑과 아이들과 교회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는데...
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여 나는 자리에 앉아있을 수 밖에 없고 신랑은 우리가족이 먹을 밥과 국을 가지러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정작 먹을 때는 밥이 코로 가는지 귀로 가는지, 혼이 나간다는 표현이 딱이지 싶었다.
그날 집에 오면서 나는 신랑에게 말했다. ‘우리가 겨우 밥한 끼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밥 먹고 오지 말자!’ <이건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닌데... 뭔가 이상해...>
그렇게 1년 정도는 교회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다.
문득 우리가정이 뭔가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.
나와 가족의 편의가 그리 중요한가? 예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는 일단 내가 편한 다음의 일인가?
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붙잡고 정신 차려야겠어!!
아!! 그때 우리교회의 일대일양육이 생각났다.
모태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도 모르게 주님에 대해 안다며 거드름 피우며 살아온 건 아닐까? 성경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...하면서 안위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?
나는 양육을 받아야 하는 부족하고 부족한 양에 불과했던 것이다.
그렇게 양육 받는 동안 매 과마다 얼마나 내 맘이 콕! 콕! 찔리고 아프던지...
성도와의 교제의 중요성을 공부할 때는 가슴이 저려왔다.
그동안 내 모습 정말 엉터리였구나...
이런 엉터리인 내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다니...
‘자기야! 나 이제 교회에서 꼭 밥먹을 꺼야!!’
일대일양육이후 첫 변화가 바로 그 ‘밥’이었다.
사람들이 겨우 밥한 끼 못 먹어서 교회에서 밥을 먹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걸
나는 왜 몰랐을까?
예배후 밥을 먹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~
1년 전처럼 여전히 정신없고 밥이 코로 가는지 귀로 가는지 알수 없지만
난 우리교회 사람들의 얼굴을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.
올해도 교회김장이 잘되서 김치가 참 맛있게 익었다는 이야기...
밥먹고 좋은씨앗 북카페 가서 차마시다가 오후예배 드리자는 이야기...
그집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번주에 구역식구들 모여서 가보자는 이야기...
율동대회 때 양말색깔을 맞춰신자는 이야기...
사진전시회때 예쁜 사진으로 가져오라는 이야기...
지난밤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더니 눈이 부었다는 이야기...
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들...
우리는 흔히들 ‘그래~언제 밥한끼 하자~’하면서 인사를 나눈다.
그렇지만 정작 그 밥한끼를 위해 시간을 내고, 약속을 잡고, 지갑을 여는 것에는 관대하지 못하다. 그만큼 바쁜 현대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다.
그런데 교회공동체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으며 교제나눌 수 있고, 불쌍한 이웃들에게 돌아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행복해하실까!
그리고 그 소중한 ‘밥한끼’를 매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!
이제는 알것 같다.
그 밥이 ‘겨우 밥한끼’가 아니라 ‘교제의 시작’이라는 것을...
결코 밥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다.
“애들이 쌍둥이 인가요?”
그도 그럴 것이 연년생으로 태어난 두 딸이 너무도 닮았다.
아이들이 연년생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부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.
세상에... 사람이 이렇게 바쁠 수도 있다니...
게다가 체구가 작은 나는 늘 몸살이 나거나 살이 빠져 주위에서 안타깝게 바라보기까지 했으니 매사 자신감 넘치던 나에게는 얼마나 새로운 세상이던지...
누군가 나를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안타깝게 바라본다는 게 너무 싫었다.
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신랑에게 집에 가자고 졸랐으니 참으로 부족한 아내의 모습까지 보이며 살았다.
그러다 하루는 이런 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? 싶으면서 밥은 먹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것이었다.
그래서 신랑과 아이들과 교회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는데...
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여 나는 자리에 앉아있을 수 밖에 없고 신랑은 우리가족이 먹을 밥과 국을 가지러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정작 먹을 때는 밥이 코로 가는지 귀로 가는지, 혼이 나간다는 표현이 딱이지 싶었다.
그날 집에 오면서 나는 신랑에게 말했다. ‘우리가 겨우 밥한 끼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밥 먹고 오지 말자!’ <이건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닌데... 뭔가 이상해...>
그렇게 1년 정도는 교회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다.
문득 우리가정이 뭔가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.
나와 가족의 편의가 그리 중요한가? 예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는 일단 내가 편한 다음의 일인가?
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붙잡고 정신 차려야겠어!!
아!! 그때 우리교회의 일대일양육이 생각났다.
모태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도 모르게 주님에 대해 안다며 거드름 피우며 살아온 건 아닐까? 성경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...하면서 안위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?
나는 양육을 받아야 하는 부족하고 부족한 양에 불과했던 것이다.
그렇게 양육 받는 동안 매 과마다 얼마나 내 맘이 콕! 콕! 찔리고 아프던지...
성도와의 교제의 중요성을 공부할 때는 가슴이 저려왔다.
그동안 내 모습 정말 엉터리였구나...
이런 엉터리인 내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다니...
‘자기야! 나 이제 교회에서 꼭 밥먹을 꺼야!!’
일대일양육이후 첫 변화가 바로 그 ‘밥’이었다.
사람들이 겨우 밥한 끼 못 먹어서 교회에서 밥을 먹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걸
나는 왜 몰랐을까?
예배후 밥을 먹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~
1년 전처럼 여전히 정신없고 밥이 코로 가는지 귀로 가는지 알수 없지만
난 우리교회 사람들의 얼굴을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.
올해도 교회김장이 잘되서 김치가 참 맛있게 익었다는 이야기...
밥먹고 좋은씨앗 북카페 가서 차마시다가 오후예배 드리자는 이야기...
그집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번주에 구역식구들 모여서 가보자는 이야기...
율동대회 때 양말색깔을 맞춰신자는 이야기...
사진전시회때 예쁜 사진으로 가져오라는 이야기...
지난밤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더니 눈이 부었다는 이야기...
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들...
우리는 흔히들 ‘그래~언제 밥한끼 하자~’하면서 인사를 나눈다.
그렇지만 정작 그 밥한끼를 위해 시간을 내고, 약속을 잡고, 지갑을 여는 것에는 관대하지 못하다. 그만큼 바쁜 현대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다.
그런데 교회공동체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으며 교제나눌 수 있고, 불쌍한 이웃들에게 돌아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행복해하실까!
그리고 그 소중한 ‘밥한끼’를 매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!
이제는 알것 같다.
그 밥이 ‘겨우 밥한끼’가 아니라 ‘교제의 시작’이라는 것을...
결코 밥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다.
0
로그인 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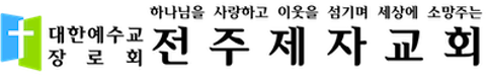

댓글목록 0